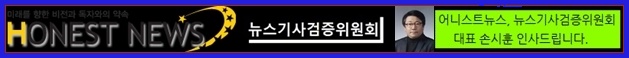TV/연예뉴스
2015-Mar-05
거문도 밥상, 쑥과 홍해삼으로 버무린 '해쑥'2015.03.05 01:06:57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바닷바람에 실려 이른 봄소식이 들려오는 곳 '거문도'. 육지에서는 4, 5월은 돼야 나기 시작하는 쑥이 거문도엔 벌써부터 지천이다.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쑥 캐는 아낙들은 정겨운 옛 정취를 자아내고, 물질하는 해녀들은 바다에서는 홍삼을, 육지에서는 쑥을 캔다. 해풍을 맞고 자라 더 향이 짙고, 부드러운 거문도 쑥은 예전부터 인기가 좋아 1960년대부터 밭에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885년 영국군들이 섬을 무단 점령했을 때는 빵 대신 거문도의 쑥개떡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논둑, 밭둑, 길가 어디서든 쑥쑥 잘 자라서 쑥이라고 불리는 쑥! 거문도 밥상을 통해 그 쑥이 우리 밥상에서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
30년 넘게 거문도에서 물질을 해온 강금자씨. 원래 직업은 해녀이지만 쑥 향기 올라오는 봄이 되면 쑥을 캐러 육지로 나선다. 물질하랴 쑥 캐랴 몸은 피곤해도 쑥은 한철 농사라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쑥을 캐게 된단다.

해삼 중에서 으뜸이라는 홍해삼과 함께 버무린 연한 해쑥은 육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진미. 다도해 청정해역 거문도에서 싱싱하게 잡아 올린 해산물과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쑥이 만나면 과연 어떤 맛일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거문도 아이들은 쑥을 캐서 가게에 가져다주고 군것질 거리며, 학용품과 바꿨다. 그 따뜻했던 봄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릴 적부터 산으로 쑥을 캐러 다녔지만 하루 종일 쑥을 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자, 산에 있는 쑥을 캐다가 밭에 옮겨 심게 되었다는 박형림씨. 그녀와 같은 이들 덕에 이제 거문도 사람들은 집근처의 밭에서도 쑥을 수확한다. 이 거문도의 쑥밭은 일거리가 없는 겨울과 이른 봄, 할머니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효자 작물이기도 하다는데… 박형림 할머니의 밭 쑥에 얽힌 뒷얘기를 들어본다.
또, 일부에서는 다금바리로 불릴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라는 능성어와 큰 것은 70센티미터에 이른다는 명품 거문도 삼치와 쑥이 어우러진 특별한 밥상을 만난다.
한편 쑥 베는 솜씨 야무지기로 소문난 이연홍씨. 그녀의 고향에는 쑥도, 바다도 없었다.
그녀가 먼 이국 땅 중국에서 섬마을로 시집온 지도 벌써 10년.
중국에서 멀리 거문도의 딸네 집에 방문했던 연홍씨의 친정아버지는 더위를 먹어가면서도 딸을 위해 3개월 동안이나 돌을 고르고 땅을 다져가며 쑥 밭을 만들어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쑥 밭에서는 매년 파릇한 쑥이 자라나는데…
이제는 중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잘 한다는 그녀의 야무진 손끝에서 차려진 쑥밥상이 기대된다.
바다 같은 넉넉한 여유로움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거문도 사람들의 성향 탓일까? 남도의 먼 바다에 위치한 섬, 거문도에는 우리의 재미있고 고유한 풍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날이면 거문도의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김으로 싼 주먹밥을 얻으러 다녔고, 복쌈이라며 그 밥을 먹어야 한 해가 무탈하고, 부자가 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은 거문도 사람들에게 설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다.
뱃일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고사를 지낸 뒤 임자 없는 바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남은 밥을 바닷가에 뿌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저런방법으로 더위를 판다. 거문도 사람들의 정월 대보름 밥상은 어떻게 차려졌을까? 쑥 철이면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쑥새알 팥죽의 맛이 궁금하다.[사진제공=KBS 1TV 한국인의 밥상]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들판에서 쑥 캐는 아낙들은 정겨운 옛 정취를 자아내고, 물질하는 해녀들은 바다에서는 홍삼을, 육지에서는 쑥을 캔다. 해풍을 맞고 자라 더 향이 짙고, 부드러운 거문도 쑥은 예전부터 인기가 좋아 1960년대부터 밭에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1885년 영국군들이 섬을 무단 점령했을 때는 빵 대신 거문도의 쑥개떡을 즐겨 먹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논둑, 밭둑, 길가 어디서든 쑥쑥 잘 자라서 쑥이라고 불리는 쑥! 거문도 밥상을 통해 그 쑥이 우리 밥상에서 갖는 의미를 찾아본다.
30년 넘게 거문도에서 물질을 해온 강금자씨. 원래 직업은 해녀이지만 쑥 향기 올라오는 봄이 되면 쑥을 캐러 육지로 나선다. 물질하랴 쑥 캐랴 몸은 피곤해도 쑥은 한철 농사라 한 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쑥을 캐게 된단다.

해삼 중에서 으뜸이라는 홍해삼과 함께 버무린 연한 해쑥은 육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진미. 다도해 청정해역 거문도에서 싱싱하게 잡아 올린 해산물과 봄의 향기를 가득 담은 쑥이 만나면 과연 어떤 맛일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 거문도 아이들은 쑥을 캐서 가게에 가져다주고 군것질 거리며, 학용품과 바꿨다. 그 따뜻했던 봄날을 기억하는 사람들.
어릴 적부터 산으로 쑥을 캐러 다녔지만 하루 종일 쑥을 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자, 산에 있는 쑥을 캐다가 밭에 옮겨 심게 되었다는 박형림씨. 그녀와 같은 이들 덕에 이제 거문도 사람들은 집근처의 밭에서도 쑥을 수확한다. 이 거문도의 쑥밭은 일거리가 없는 겨울과 이른 봄, 할머니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효자 작물이기도 하다는데… 박형림 할머니의 밭 쑥에 얽힌 뒷얘기를 들어본다.
또, 일부에서는 다금바리로 불릴 정도로 그 맛이 일품이라는 능성어와 큰 것은 70센티미터에 이른다는 명품 거문도 삼치와 쑥이 어우러진 특별한 밥상을 만난다.
한편 쑥 베는 솜씨 야무지기로 소문난 이연홍씨. 그녀의 고향에는 쑥도, 바다도 없었다.
그녀가 먼 이국 땅 중국에서 섬마을로 시집온 지도 벌써 10년.
중국에서 멀리 거문도의 딸네 집에 방문했던 연홍씨의 친정아버지는 더위를 먹어가면서도 딸을 위해 3개월 동안이나 돌을 고르고 땅을 다져가며 쑥 밭을 만들어 주셨다.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쑥 밭에서는 매년 파릇한 쑥이 자라나는데…
이제는 중국음식보다 한국음식을 더 잘 한다는 그녀의 야무진 손끝에서 차려진 쑥밥상이 기대된다.
바다 같은 넉넉한 여유로움과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거문도 사람들의 성향 탓일까? 남도의 먼 바다에 위치한 섬, 거문도에는 우리의 재미있고 고유한 풍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옛날부터 정월 대보름날이면 거문도의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김으로 싼 주먹밥을 얻으러 다녔고, 복쌈이라며 그 밥을 먹어야 한 해가 무탈하고, 부자가 된다고 믿었다. 정월대보름은 거문도 사람들에게 설만큼이나 중요한 날이다.
뱃일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고사를 지낸 뒤 임자 없는 바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남은 밥을 바닷가에 뿌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저런방법으로 더위를 판다. 거문도 사람들의 정월 대보름 밥상은 어떻게 차려졌을까? 쑥 철이면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는 쑥새알 팥죽의 맛이 궁금하다.[사진제공=KBS 1TV 한국인의 밥상]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대표 손시훈 기자의 최신 뉴스기사